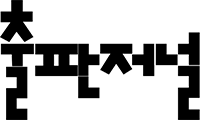글 / 정윤희 (책문화생태학자, 문화평론가)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인프라이자 세계 속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K컬처의 거점이다. 건축적 공간미와 문화적 상징성은 하드 파워를 보여주고,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독서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은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낸다.
문화강국의 토대는 책문화의 풍요로움에서 비롯된다. 책문화는 쉽게 말해 말하고 쓰고 읽는 행위에서 출발한다. 문자 언어는 케이팝의 노랫말이 되고, 영화의 시나리오가 되고, 드라마의 대사가 된다. 이처럼 K컬처의 뿌리에는 책문화가 놓여 있기에, 정부가 도서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풍요로운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실천이 필요하다.
프랑스 철학자 기 드보르는 '스펙타클의 사회'라는 책을 통해 현대 사회를 이미지와 소비가 지배하는 구조로 설명했다. 화려한 상업 공간이 문화를 주도하는 시대에 도서관은 책과 문화를 중심으로 다른 유형의 스펙타클을 만들어낸다.
뉴욕공립도서관, 상하이 도서관 이스트홀, 헬싱키 오디도서관, 암스테르담 공공도서관 등은 아름다운 건축미, 도서관 서비스, 시민 참여가 어우러지며 도시의 상징적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도서관들은 전 세계 사서들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들러보는 관광자원이 되었다.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문화를 즐기며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을 공유한다. 도서관은 공공적 스펙타클의 장이 되는 것이다.
도서관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상의 학교이며 책문화 자본이 응집된 공간이다. 스펙타클 사회 속에서 지식과 공론장의 힘을 드러내는 곳이기도 하다. 책문화는 한국 문화의 서사를 만들어내며, 도서관은 그 서사를 축적하고 확산시키는 책문화생태계를 활발하게 만드는 동력이다.
그동안 우리의 도서관 정책은 지역의 공공 인프라로 머물러 있다. 이 마저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도서관법'에 근거한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의 공공도서관 등을 연결하는 허브이자 관광 자원으로 확장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광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등을 연결한 도서관 관광 지도를 만들어 홍보하고 이를 국내외에 알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도서관을 국가 브랜드를 빛내는 문화 자본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